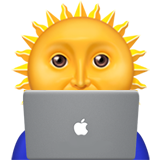불타버린 지도, 아베 코보, 이영미 역, 2013, 문학동네
Moetsukita Chizu, 1967, Abe Kobo

p. 14
다시 살펴보니 오가는 사람도 꽤 있지만 초점이 너무나 아득한 이 풍경 속에서는 이간이 오히려 가공의 영상 같다. 그렇지만 이곳 생활이 익숙해지면 입장은 역정되어 버리겠지. 풍경은 점점 더 아득하게, 거의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투명해지고, 내 모습만이 네거필름에서 인화된 화상처럼 떠오른다. 스스로 나 자신을 분별해낼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나같이 똑같은 인생의 정리대가 몇백세대 늘어서 있든 어차피 각각의 가족사진을 유리 액자틀에 지나지 않을테니까...
pp. 287-288
누구를 위해 맥이 뛰는 것일까. 자기도 모르는 새에 계속해서 맥이 뛰는 이 거대한 심장.... 도시.... 자세를 바꿔서 그녀를 찾는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이미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있지도 않은 그녀를 바라보는 나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pp. 311-312
딱히 진공 속에 내동댕이쳐진 것은 아니었다. 진공은 커녕 멀리까지 전망이 탁 트인 거대한 단지였다. 고지대인데도 4층ㄱ짜리 주택 단지가 어디운 골짜기 바닥에 가라앉아 규칙적인 빛의 격자를 펼치고 있다. 설마 이런 풍경이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상상도 못했다는 그 점이 바로 문제인 것이다. 마을은 공간적으로는 명백하게 존재하지만, 시간적으로는 진공이나 전혀 다를 바 없다. 존재하는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가. 네 개의 차박퀴는 확실하게 지면에 닿은 채 굴러가고, 내 몸은 그 진동을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들이며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을은 사라져버린 것이다. 역시 이 커브는 넘어서지 말았어야 했는지 모른다. 이로써 커브 너머에 도달하는 건 영원히 불가능해져버린 셈이다. 하얀 수은등의 원근법. 한 걸음마다 투명해져가는, 귀가를 서두르는 사람들 무리...
-아베 코보의 소설은 보통의 내러티브처럼 편안히 마무리되지 않아서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너무나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