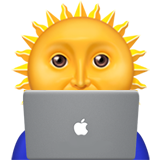유토피아 실험, 딜런 에번스, 나현경 역, 2019, 쌤앤파커스
The Utopia Experiment, 2015, Dylan Evans

p. 8
50년 전에 일어난 그 무시무시한 재앙이 우리에겐, 음, 행운이었다고 생각해본 적 없습니까? 아주 불경한 말로 들리겠지요.. 하지만 그 재앙 덕분에 더 흥미진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닐까요?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 다소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삶이란 으레 그런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갔겠죠. 우린 이제 20세기의 가치에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걸 압니다. 효력이 있었다면 그렇게 세계가 무너지진 않았겠죠. 그 '사고' 덕분에 삶 그 자체처럼 중대한 것들을 더 잘 인식하게 되지 않았느냔 말입니다.
-브라이언 올디스 <노인>(1954)
p. 36
하지만 전 지구화된 세계에 산다는 것은 한편으로 곤경이 빨리 퍼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pp. 52-53
그러나 인간 사회가 연구소의 로봇들과 매우 다른 점도 있었다. 우리는 대개 '무리지능swarm intelligence'이라 알려진 집단행동을 중점적으로 연구했다. 여기엔 아주 단순한 로봇 다수가 무리지어 일하도록 설계하는 일이 포함되었다. 로봇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그 자체로는 지능이 낮지만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혁력시키면 일종의 집단 지능, 또는 무리 마음hive mind이 생겨난다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인간 사회는 정반대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우리 인간은 매우 지적인 생명체다. 그러나 사회를 이루면 일종의 집단 어리석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처럼 보인다. 스코틀랜드의 저널리스트 찰스 매케이가 1941년에 쓴 책에서 이를 '대중의 광기'라 부른 것은 매우 유명하다. 이 책은 투기 거품, 십자군 전쟁, 마녀사냥 등 대중이 미망에 빠진 역사를 연대순으로 정리했다. 매케이는 말한다. "인간은 무리로 있으면 광기에 빠졌다가 오직 한 명씩 천천히 제정신으로 돌아온다."
p. 175
"낙원 한복판에서의 권태로 인해 우리 첫 조상은 마음에는 심연에 대한 갈망이 싹텄다." 철학자 에밀 시오랑은 이렇게 썼다.
pp. 205-206
종말 이후의 세계에 폭력이 만연할 가능성이 있기에 방어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더 깊어질수록 초기 시나리오에서 꿈꿨던 유토피아적 세계의 전망은 점점 더 암울해졌다. 내가 상상한 전개는 과학 소설가 브라이언 올디스가 경멸적 어조로 '아늑한 파국cozy catastrophe'이라 일컬은 상황의 전형적인 예시였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장 잘 드러난 소설은 아마도 윌리엄 모리스의 <유토피아에서 온 소식>일 것이다.
p. 209
문명은 모래 늪과도 같다. 벗어나려 애를 쓸수록 더 깊이 빨아들여 규칙과 규제로 질식시키기 때문이다. 나는 원시적 생활을 실험하기 위해 무수한 관료주의적 절차를 통과해야만 하는 아이러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전혀 재밌지 않은 아이러니였다. 유토피아 실험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서류 작업에서 해방된 삶을 약속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서류 작업에 파묻혀 질식해가고 있었다.
p. 234
에밀 시오랑은 "우리가 어떤 신념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것이 진실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모호한 힘에 떠밀려서다. 이 힘이 떠나고나서 남겨진 것과 단 둘이 대면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휘청거리며 무너지고 만다."라고 썼다.
p. 273
훌륭한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는 증거는 결코 믿지 마라. 과학의 작동 원리로 여겨지는 일반적 관점을 기발하게 뒤집은 문장이다. 위 관점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일리가 있다. 고등학생이 실험실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을 때 우리는 화학 분약의 전체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그 학생이 실수를 저질렀을 거라고 추정할 뿐이다. 견고한 이론이라면 이론 자체를 의심하기보다 변칙적인 데이터를 기각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다.
p. 305
자급자족이 환상이라면 지속 가능성 또한 환상이다. 잠재적으로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에서 정말로 지속 가능한 것은 없다. 모든 것엔 끝이 있다.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처음에 소설인 줄 알고 표지를 열었는데, 문체가 소설의 문체는 아니었다. 다소 가벼운 논문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번역서로는 글을 잘쓴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이 그렇게 단단한 기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늘 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글을 잘쓴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실패한 실험을 보여주는 것은, 학자에게는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닐 것이다.
*루소와 홉스 사이에서.
*그리고 나는 키에르케고르의 <불안의 개념>을 떠올렸다.
**브라이언 올디스 <노인>(1964)
데이비드 로젠한이 1973년 발표해 유명해진 논문 <전싱병원에서 제정신으로 지내기>
유나바머 선언문, 카진스키
스티븐 핑커 <빈 서판>
영화 <포스트맨>(1997)
**오프그리드(off-grid) 전기, 상하수도 등 사회 기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자급자족해 사는 생활 방식
cozy catastrophe. 영국의 저명한 과학 소설가 브라이언 올디스가 2차 세계 대전 이후 영국에서 유행한 과학 소설의 조류를 비판적으로 지칭하기 위해 만든 용어. 대체로 문명이 붕괴된 후 운좋게 파국을 피한 소수의 생존자들(특히 중산층 백인 남성)이 문명을 재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