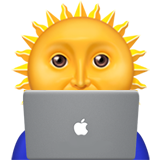풀이 눕는다, 김사과, 2009, 문학동네

- 그녀를 짝사랑하는, 사진을 전공하는 남학생
- 난 멍하니 선채 꿈의 한 조각이 사라지는 장면을 바라보았다. 뭔가 굉장한 게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난 생각했다. 아니 그러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아니었다. 결국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의 삶이 겹쳐졌던 유일한 조각이 이렇게 쉽게 사라져 버리다니. 그런 일은 흔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란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난 그조각을 움켜잡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전에 손을 뻗어야 한다. 그 조각에 찔려 상처를 입게 되더라도 그건 나중의 일이었다. 중요한 건 지금이다. 이순간.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그가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 그것뿐이었다.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다.
-...난 깨달았다. 정말로 끝나버렸다는 걸. 내가 정말로 모든 걸 망쳐버렸다는 걸. 하지만 정말 많은 기회들이 있었다는 걸. 내가 흘려보낸 기회들이 우리가 함께보낸 순간들 만큼 많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난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우리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 이나라 사람들은 용서하거나 이해하거나 혹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같이 살아가는 법을 안다.
- 남은 것은 그 삶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뻔뻔함과 얄팍한 위안 뿐이었다. 우리는 이제 서로 외에는 아무도없다는 것을, 손을 잡아줄 사람은 서로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건 끔찍한 깨달음이었다. 우린 단지 너무 외로워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잡아줄 손이, 그 손을 올려놓을 어깨가 필요했다. 아니 그저 살아있는 것이 필요했다. 그게 거북이건 염소건 상관없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고 생각했다.
*2014년 다이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