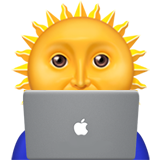1002번째 밤: 2010년대 서울의 미술들, 윤원화, 2016, 워크룸프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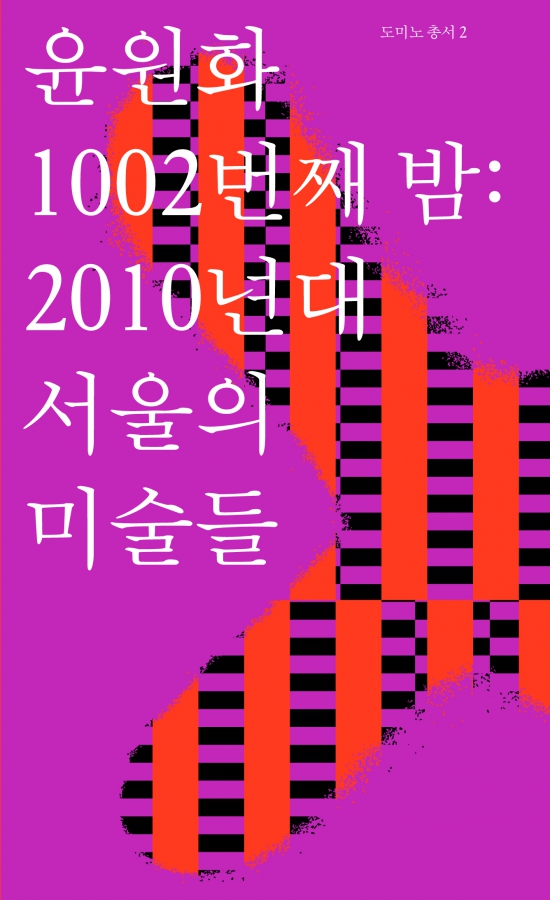
1장 매혹하는 폐허
pp. 39-40
그동안 얼마나 많은 폐허 공간들이 사라지고 또 생겨났는지, 폐허를 다룬 작업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보면, 우리 눈앞의 폐허는 진부하다 못해 조금은 불길해 보이기까지 한다. 결국 폐허 애호는 밝은 미래를 불러오지도 과거를 진지하게 탐구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현재를 낯설고 기괴한 것으로 소비하는 데 불과하지 않은가? 어느 정도는 그렇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폐허는 낯설고 기괴해진 현재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런 시간이 몇 년이나 계속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폐허를 기계적으로 향유하거나 배척하기에 앞서 한번쯤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나의 폐허가 아니라 여러 개의 폐허들을, 서울의 여기저기서 폐허들이 생산되고 사용되었던 시간 자체를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다.
p. 47
....특별히 잘났거나 못난 것 없이 현재의 일부를 구성하던 너무 많은 것들이 삽시간에 과거로 밀려난 탓에, 폐허 애호는 어쩔 수 없이 종종 분열증적 감각을 수반했다. 현재의 시간에서 뜯겨나온 것들의 생생한 절단면이 지금 여기를 집어삼키면서, 관찰자가 과거를 향수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로 폐허에 매혹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자신의 발아래가 뒤흔들리는 것을 촉각적으로 느끼지만 그와 동시에 마치 제3자가 된 것처럼 그 흔들림을 먼발치서 응시한다. 이 같은 폐허 애호는 특히 서울 구도심의 가까운 과거를 파헤쳐놓은 뉴타운 사업의 흥망성쇠와 맞물려 빈번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20세기라는 시간이 근본적으로 그렇게 먼 과거가 아닌 탓에, 서울에서의 폐허 애호는 언제 어디서든 발밑이 꺼지는 싱크홀과 마주칠 위험을 잠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pp. 78-79
폐허와 폐허를 잇는 작은 방송국이 되어 떠돌거나, 폐허와 폐허의 사이에서 작은 작업장 또는 극장을 가설하는 것.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2000년대가 남긴 폐허에 대처하는 방법이었다고 하자. 그것은 미술사 또는 미술 제도를 배경으로 작동하는 그림자극이 아니라 당대의 도시와 겹쳐놓아야만 온전하게 보이는 풍경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접근은 어떤 특정한 폐허의 기억이 전제될 때에만 비로소 설득력 있는 풍경이 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얼음처럼 또는 콘크리트처럼 쉽게 깨어지고 휘발하는 우리의 도시에서 기억은 거의 축적되거나 전파되지 못한다. 기억의 부재 속에서, 폐허는 응당 읽을 수 없기에 누구도 크게 괴롭히지 않는 아련한 공허로, 그저 어디서 본 것 같은 또 하나의 권태로운 스타일로 무기력하게 재생산된다. 그리고 이 같은 폐허의 경험은 다시 기억의 불가능성으로 되먹임된다. 공통적인 시간의 흐름에서 절단된 것 같은 폐허 특유의 고립된 시간성이 도시의 일반적인 상태로 자리잡으면서, 기억 산업과 기억의 전쟁이 곰팡이처럼 번성한다. 하지만 그것은 기억의 구멍을 막을 수 없다는 불길한 신호를 되려 증폭할 뿐이다.
2장 가장 희미한 해
pp. 88-89
과거의 미래주의와 그 실현으로서의 현재 사이에는 명백한 간극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는 지난 세기의 독창적인 미래주의자를 기리는 미술관이 우리 세기에 어떻게 존속할 수 있는가 하는 까다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백남준아트센터 초대 관장으로 2008년 개관전을 지휘했던 큐레이터 이영철의 말을 빌리자면,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의 자연 법칙 그리고 일체의 상대적 관념과 잡념에서 벗어나 (...) 무목적적인 자유와 해방을 획득해가는" 한 예술가의 "영구적인 자기 혁명"을 이어나가야 한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죽은 백남준이 생로병사를 초월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후에도 백남준식 영구 혁명을 지속시키는 미술관의 존재가 ⎯백남준 본인의 말을 빌리자면 "박남준이 오래 사는 집"이⎯필수적이다. 과거는 미래에 의해 좌우되고, 미래는 다시 과거에 의해 좌우된다. 이는 양방향적으로 해방된 시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중층 결정되는 시간이다. 양 옆에서 압력을 가하는 시간의 틈새에서, 미술관은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노래해야 한다. 그것은 누구의 노래이고, 어떤 노래인가?
p. 101
문서는 물신화될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도 신성해질 수 없는 무언가 좋은 소식을 전하기 이ㅜ해 기꺼이 양산될 수 있는 부차적 신체, 미술의 순수한 도구로서 인미공의 허리를 떠받친다.
3장 제도가 유령이 될 때
p. 162
텅 빈 시간 속으로 내던져진 이벤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작은 무덤만이 남는다. 작가는 작업이나 작가가 담길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적 그릇을 확보하려 했지만, 그 시도는 오히려 공간적 그릇에 상응하는 어떤 시간적 그릇의 빈자리를 드러내고 만다.
부연 관광객의 시점
pp. 204-205
...전시장에 연출된 꿈의 무대는 기획자와 관객, 주최 기관을 통틀어 우리 모두의 기원으로서 서울이라는 미디어-도시를 맹점에 가둠으로써만 성립한다. 동질적 전 지구화에 오염된 장소로서든, 역사가 역류하는 막다른 골목으로서든, 또는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지금 여기의 서울은 잘 보이지도 않고 볼 필요도 없는 무언가 지긋지긋한 것으로서 무대 바깥에 격리된다. 이것이 궁극적인 반성의 결과인지 아니면 반성의 궁극적인 중단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도시가 순수한 극장으로 탈바꿈하고, 그 속에서 역사적 시간의 후일담이 동시대적 시간의 파산을 덮을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이 도시의 일부라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는다.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가시적이고 과거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비가시적인 이 극장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다. 만약 그것이 불타오른다면, 분명 거기에는 유령들의 웃음소리가 진동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허공을 가르는 웃음 소리로 흩어질 수 없다. 우리는 유령이 아니기에, 우리에게는 다른 꿈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