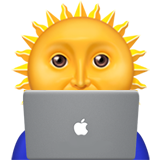MMCA 연구 포럼 2019 | 부재하는 아카이브: 디자인, 건축, 시각문화, 2019,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MMCA Research Forum 2019 | Re-inventing Archive: Design, Architecture, Visual Culture, 2019, MMCA

정다영, '도무스'와 '아르케이온' 사이에서: 전시로 촉발하는 아카이브 실천
p.20
미술관이라는 제도 속에서 건축의 시간은 "누적되는 발전의 시간이라기보다 언제나 미처 예측하지 못한 악조건 속에서 고분분투하는 시간에 가까웠다." 1 이러한 시간 속에서 만들어가는 미술관 건축 아카이브는 '목록(list)의 형식'이 아니라 '서술(narrative)의 형식'에 놓인 아직은 부재하는 아카이브에 가깝다.
김상규, 디자인 아카이브는 왜 그토록 복잡한가
p.37
기억 담론에서 보자면 문화재청의 유물, 문화재 개념은 전진성이 말한 과거의 재신화화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디자인 아카이빙은 집단 기억보다는 문화기억(cultural memory)에 가깝다. 문화 기억은 과거 사실에 대한 인간 기억의 외재화, 물화된 차원으로 넓게 정의될 수 있다. 또한 집단 기억이 기념비 설립, 문화재 지정 같은 근대 국민국가의 현상이라면, 문화 기억은 공식 역사에 담기지 않은 이야기들을 수용하는 것이다.
전가경, 한때 혹은 지금, 미술 출판의 가장자리에서: 한국의 90년대 전시 도록
p.61
전시 도록은 미술 출판의 가장자리를 점한다. 전통적으로 전시에 예속된 전시 도록의 특수성은 전시 도록을 전시의 등가물이기보다는 작품 이미지 묶음 정도의 인쇄물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물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전시라는 '매체'는 상대적으로 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전시 도록 덕분에 전시의 시간을 일정 부분이나마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시 언어를 되풀이할 뿐, 인쇄물이라는 공간에 특화된 언어가 아니다. 전시에 대한 도록의 종속성은 전시와 차별화될 때 극볼될 수 있다. 지나간 전시에 대한 소극적 의미에서의 증빙자료가 아닌, 전시와 평행하거나 이로부터 독립한 능동적 매체가 될 때 전시 도록은 하나의 '개념'이 될 수 있다. '한국의 90년대 전시 도록'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장르이자 개념이었다. 1990년대라는 시대적 후광을 입고, '한국의 90년대 전시 도록'은 과거 전시 도록의 관습과 관행을 뛰어넘어 그 스스로가 하나의 개념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남겼다. 그곳엔 한국 미술계가 —아마도 처음—경험한 어떤 논의의 초석이 깔려 있다. 가령, 미술가의 출판, 디자이너의 출판, 미술가와 디자이너의 협업 양상 등이 그렇다. 1990년대 한국 디자인 및 미술계는 미술과 디자인의 상관관계를 탐색하는 생산적 플랫폼으로서 이미 '도록'의 사전적 정의를 넘어서고 있었다.
김장언, 그때 우리는 왜 모였던 것일까?—도시, 이미지, 말
p.75
나는 4가지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그것은 포럼에이, 피진 컬렉티브, 우적, 베반 패밀리이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떠오른 단어는 '도시주의'였다. 이 모든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도시주의에 대한 논의에만 집중한 것은 아니었지만, 도시주의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그것을 결과물로 만들어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참여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1990년대를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 1990년대는 한국사회가 문화적 전환을 맞이한 시기로 그 중심에는 '이미지'로 표상된 시각문화라는 것이 있었다. 시각문화를 접근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1990년대 한국의 상황에서 시각문화는 도시, 특히 메가 시티로 변해가는 서울이라는 도시와 그 시각문화에 집중한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시각적인 것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도시의 다양한 문화형식들 그리고 도시가 만들어내는 시각성에 대한 것이기도 했다.
pp. 79-80
우리는 왜 모였던 것일까? 그리고 지금은 다시 모이지 않고 각자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서울이라는 도시의 성장과 더불어 변화되는 시각 환경 속에서 이미지와 말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은 시각문화와 관련된 어떤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자 했다기보다는, 어쩌면 도시라는 공간 속에서 우리의 자율적 공간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유희적) 생산물을 만들며, 삶을 영위하고 (예술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매우 무정부주의적 낭만이었던 것인지도 모른다.(끝)
- 윤원화, 「문서를 재생하기: 미술관에서 건축을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 『종이와 콘크리트: 한국 현대건축 운동 1987-1997』(서울: 국립현대미술관, 2017), 268쪽.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