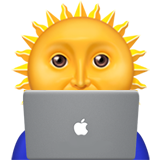1:1 다이어그램; 큐레이터의 도면함, 현시원, 2018, 워크룸프레스
The Dody in Pieces: the fragment as a metaphor of modernity, 1994, Linda Nochlin

말 없는 어떤 여름밤: 남화연
p. 42
미술관이 문을 여닫는 시간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추세가 있다. 점점 더 밤에 가까워질 때까지 문을 열어두는 것이다. 미술관은 될 수 있는 한 열린 환영의 제스처를 취한다. 그러나 닫혀 있는 시간과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있다. 구획되고 한정된 자리에서 '보이는 것'만을 다시 반복적으로 보기를 제안한다.
뭐가 안 보이는지 보려고: 구동희
pp. 58-59
보도 자료에 녹아든 미래 시제는 불완전하다.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의 살점은 도려내고 가능하면 몇 가지 특징을 압축적으로 뽑아내야 한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전시에 관해 글을 쓰는 건 어디까지 밀고 나가야 하는지, 무엇을 얼마나 믿으며 써야 하는지 숙고하는 과정이다. 준비 중인 전시를 미래완료 시제로 둔갑시키는 일은 간단해 보이지만 오묘하다. 지금 스코어, 알 수 없는 것과 미완결 상태인 것들은 빼버려야 한다. 이 형식 위에 올라선 문장은 근 미래의 관객이 전시장에 오기 '이전'에 읽었을지 모르는 기사와 전시를 본 '이후'에 읽게 될지 모르는 미술 월간지의 리뷰보다 앞선 시간대에 있다.
내가 떠올린 두 가지: 전소정
p. 86
나는 꿈을 같이 꾸자는 전소정의 제안에 두 가지를 떠올렸다. 하나는 4010개의 시신이 발견된 종교 단체의 마을이다. 꿈에 동원되는 것은 언제나 공간적 경험이며 이 공간은 특정 마을로 형상화되는 경우가 많다.
지구의 기울기: 남화연
p. 104
새소리를 아카이빙하고(<필드 레코딩>), 개미의 경로를 따라가보고(<개미 시간>), 벌의 춤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각각의 생명체들이 사는 시간만큼을 투자해야 한다. 살아보지 않고 알 수 없는 시간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존 시간의 룰을 위반하며 뛰어넘는 일이다. 다른 XY축의 그래프를 그려갈 하얀 종이를 일단 찾아야 한다.
어쩌다 보니 커져버리는 것들: 정금형
p. 125
정금형: ...[개인 소장품]전도 이전 공연에 썼던 오브제를 가져다놓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다가 나온 특정한 연극적 상황이에요. 공연에 썼던 오브제가 있고, 비디오가 있고, 그것들이 모두 수집된 소장품으로서 전시장에서 연기하는 거죠. 개인 소장품을 전시한다는 극적 상황인 거에요. 제가 없어도 작동하는 연극이라고 생각해요.
스크린 샷의 마음: 윤향로
p. 265
물론 이러한 변신이라는 것은 오늘날 다른 말과 상태가 되어간다. 먼저 휙 로그아웃 해버리면 그만인 온라인 세계의 테크니컬하고 순간적인 변신으로 인하여 전후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는 자잘한 소비를 자극하는 것과 연관될 뿐이다. 또 모니터와 액정 위에서 대상의 표면과 크기를 이리저리 손가락으로 변환시켜보는 시간을 지연함으로써 결국은 스스로 변이시켜볼 수 있는 틀(frame)이나 툴(tool)이란 없음을 재확인하는 데 변신 모티브가 사용된다.
pp. 267-268
전원과 연결하여 충전하지 않아도 캔버스는 언제나 켜져 있다. 액정과 모니터는 스스로 발광하는 듯 보이지만 전원이 꺼지면 암흑이다. 늘 충전해야 한다. 그러나 언제가 그 자체로 독자적으로 벽면에 존재할 수 있는 캔버스는 자기 충족적이다. 다른 사물들이나 여타의 정보, 잔여물들과 연결되지 않는 척을 한다.
✨각자의 외부
p. 325
이럴 때 작가에게 큐레이터는 어떻게 존재할까? 질문을 바꿔 전시 기획 행위에서 유일하게 떨어져 나와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요소는 뭘까? 작가에게 큐레이터와 전시 기획과 관련된 기타 행위들은 첫째 미술 제도에 진입하는 절반 정도의 행동 양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니까 '최초예술지원', '중견작가 작품집 발간 지원' 등의 이름으로, "생애 주기"에 따라 작가의 작품 제작을 지원하는 루트를 설계한 서울문화재단과 같이 큐레이터 또한 어떤 방식으로든 미술의 경로를 스스로 유통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 말이다. 서울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의 각종 지원 제도가 확인해야만 하는 보고서에는 작품의 '비평'적 존재 가치가 자리할 가능성이 대거 배제되어 있다. 일단 주어진 마감 시한 안에 작품이 기획-생산-보고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에서 작품은 점차 시연/마감 가능한 유사 활동들이 되고, 양적 평가를 위한 엇비슷한 템플릿들이 반복될 뿐이다. 둘째 자신의 미술 자체를 자기 어법으로 시연하고 연구하는 방법으로서의 작가적 제안이 지금 여기의 '기획'일 수 있다. 토니 베넷이 쓴 "전시복합체"라는 용어에 빗대어 보면 오늘날 일군의 작가들이 소극적이고 또 적극적인 활동은 어쩌면 '전시협업체'로서 단순한 구조를 투명하게 비춘다. 전시 공간 구성이나 전시 서문, 책자의 제작 방식까지 '협업'은 어떤 면에서 과잉된다. 필자들은 목차에 실린 이름 제공자가 되고, 토크는 현장의 내용보다 미리 공지 홍보되는 타이틀이 중요하게 작동한다.
*현시원, 작업실의 재구성: 참여와 협업의 다층적 형태로서의 '스튜디오', 비주얼 10호
*앤디워홀 엠파이어Empire, 1964
미술사학자 줄리아나 부르노
*boris groys, "the loneliness of the project" 읽어볼 것.
-'각자의 외부' 텍스트 하나만으로도 이 책은 현시원이라는 큐레이터랑 '함께 꿈꿀 수 있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