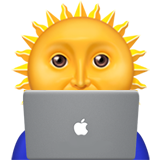모든 것을 무릅쓴 이미지들, 조르주 디디 위베르만, 오윤성 역, 2017, 레베카
Image Malgré tout, Georges Didi-Huberman, 2004
p.37
존더코만도의 일원들이 아우슈비츠에서 얻어낸 네 장의 사진은 따라서 또한, 나치스가 가리고자 했던, 다시 말해서 단어와 이미지가 없게 만들고자 했던 세계에서 얻어낸 네 가지 '반박'이었다.
p.51
기억하기 위해서는 상상해야 한다. 그래서 필립 뮐러는 "기억들"이라는 그 이야기에서 이미지가 발생하게끔 하며 이미지의 엄청난 속박을 우리에게 누설한다. 이 속박은 이중적이다: 단순성과 복합성. '단자'의 단순성. 따라서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언정, 그 어떤 요소도 제거될 수 없는 전체로서, 즉시 이미지는 그 텍스트 속에서 돌발한다-그리고 우리의 독해 속에서 불가결하다.
p.54
존더코만도의 일원들이 찍은 네 장의 이미지가 무엇인지가 바로 정확히 이것이다. "진실의 순간들." 많지 않다.....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기". 자신의 선조들pères로 부터, 자신의 지표들repères로부터, 자신의 세계로부터, 자신의 사유로부터. "이 잔인한 이미지들을 본 후에, 자네는 그토록 추악한 행동이 범해질 수 있는 세계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것이네. 자네의 선조들과 자네 자신으로부터 떠나게. 왜냐하면 틀림없이, 이른바 교육받은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행동들을 본 후에, 자네는 인간 가족의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싶을 것이네."라고 그는 쓴다. 그 이미지들에 대한 상상을 지탱할 수 있기 위해서는 "[......] 자네의 심장은 돌로 그리고 자네의 눈은 사진기로 변형되"어야 한다고 그는 끝내 말한다.1
pp.64-65
참을 수 없었고 불가능했다. 그렇다. 그러나 "상상해야 한다"고 필립 뮐러는 그래도quand même 요구한다. '모든 것을 무릅쓰고 상상하는 것', 우리에게 이미지에 대한 어려운 윤리-전형적인 비가시적인 것(심미가의 게으름)도 아니고 끔찍함의 성상(신앙인의 게으름)도 아니고 단순한 기록(학자의 게으름)도 아닌-를 요구하는것. 불충분하지만 불가결한, 부정확하지만 진짜인 하나의 단순한 이미지, 물론 역설적 진실의 진짜 이미지. 나는 이미지란 여기서 '역사의 눈'이라고 말하겠다. 볼 수 있게 만들려는 그 끈질긴 사명. 그러나 나는 또한 이미지는 '역사의 눈 속에' 있다고도 말하겠다.2
p. 93
그러나 바이츠만은 사실들의 질서를 이미 떠났다. 그가 보기에는 "수정할 수 있는" 질서는 그다지 강하지 않다. 그에게는 더 이상 "사실"은 필요가 없고 "테제"가 필요하다. "그 테제는 정확성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한다. 그 테제는 절대적이며 수정할 수 없다."3
p. 102
존재 자체와 증언들의 형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교조를 강력히 반대한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상상하는 행위를 자신의 모순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비극적 경험으로서다. 아우슈비츠 존더코만도의 일원들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이 네 장의 학살의 사진을 얻어내기로 결심한 것은 나치스가 자신들의 범죄가 상상할 수 없기를 원했기 때문이다.....이미지를 생산하는 것은 단언적 역량이자 비르케나우의 비밀 사진가들 편에서의 '정치적 저항'의 행위였던 반면에, 오늘날 모든 이미지를 거부하는 것은 그 사진들로부터 우리를 바라보는 참화에 직면한 순수한 회피의 무능력이 되며, '정신적 저항'의 증상이 된다.
*아우슈비츠에서 온 사진 네 장으로 자신의 논점을 전개하는 과정은 매우 흥미롭고 매력적이다.
하지만 그것에 비해 본 책의 번역은 진짜...추천하지 않는다.
불어 원어를 직역하고, 다듬지 않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몇몇은 문장이라고 보기도 힘들었다.
'번역'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역자와 나의 생각은 좁아지지 못했고 결국 책을 덮어버렸다.
*주변에서 랑시에르 감성의 분할도 "모든 것을 무릅쓴" 번역때문에 꽤나 골머리를 앓는 책이라고 평가되었는데, 놀랍게도 같은 역자이다.
*대학교 1학년 때 조르주 바타이유 『눈이야기』를 읽다가 포기했었는데, 그 때 이후로 처음 읽지 못하겠는 책이었다.
굳이 읽고 싶다면 불어 원서와 비교하여 읽기를 바란다.
모쪼록....조르주 디디 위베르만의 책은 국내가 아직 많이 번역이 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나라 선생님의 번역이 제일 깔끔했던 것 같다.
*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고 온라인 상의 유영하는 글자로 남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각주로 넣었어야 할 내용들이 미주로 빠지면서 글을 읽기가 더 힘들다. 목차 부분의 좌우정렬의 배치는 번역의 서막이었다.
**
그리고 번역에 대해서 위에서 이야기를 계속 한 것처럼. 디디 위베르만이 아우슈비츠 사진을 논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내가 역자와 나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다고 말하는 바와 같이, 디디 위베르만과 몇몇 학자들의 논쟁이 오갔었다. 그리고 그러한 논쟁에 반박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상황과 오버랩되는 것은 최근에 영화 <생일>이 개봉하고, 세월호 문제가 다시 회자되는 상황이었다
세월호와 같이 큰 인재들은 -그것의 심각성이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비단 예술가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창작의 그린벨트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다. 누군가가 그것을 대상으로 창작을 하는 것은 암묵적으로든 금기시되는, 혹은 우려되는 일이었다.
***조르주 바타유 『유대인 문제에 관한 성찰』
M. Blanchot, L'Écrtture du désastre, Paris, Gullimard, 1980, p.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