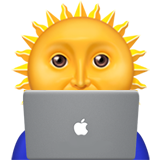✨모래의 여자, 아베 코보, 김난주 역, 2001, 민음사
The Woman in the Dunes, 1962, Abe Kobo

p.7
벌이 없으면, 도망치는 재미도 없다.
p.34
여자는 엎드린 자세로 불꽃을 쳐다보면서, 여전히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다. 아무래도 일부러 보조개를 보이려는 것 같아,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긴장한다. 한 가족의 죽음을 얘기한 직후라서 더욱 음란하게 여겨졌다.
p.46
모래 쪽에서 생각하면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이 허망하다. 확실한 것은 오로지 모든 형태를 부정하는 모래의 유동뿐이다.
p.55
알몸의 여자를 손바닥으로 갈기면 과연 기분을 후련할 것이다. 그러나 일이 그렇게 되어서야 상대방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벌이란, 죄값을 치렀다고 인정하는 행위나 다름없으니까.
p.57
의사태 발작이란 말이 있다. 어떤 유의 곤충이나 거미가 불의의 습격을 받았을 때 보이는 마비 상태다. 붕괴된 화상, 미친 인간에게 관제탑을 점거당한 비행장. 겨울잠을 자는 개구리에게 겨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능한 일이라면 자신의 정지가 세계의 움직임까지 정지시켜 버렸다고 믿고 싶었다.
p.81
풍경이 없으면 그나마 풍경화라도 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이다. 그래서 풍경화는 자연 경관이 살벌한 지방에서 발달하고, 신문은 인간 관계가 소원한 산업 지대에서 발달한다고 어떤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p.153
과연 노동에는, 목적지 없이도 여전히 도망쳐 가는 시간을 견디게 하는, 인간의 기댈 언덕 같은 것이 있는 모양이다.
언제였던가, 뫼비우스의 띠가 같이 가자고 하여 무슨 강연을 들으러 간 적이 있었다.....
<노동을 극복하는 길은 노동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노동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으로 노동을 극복하는..... 그 자기 부정의 에너지야말로 진정한 노동의 가치입니다.>
p.213
잎이 팔랑팔랑 흔들리는 나무...... 도망치고 싶어도, 뿌리와 연결되어 있어 도망치지도 못하고 팔랑팔랑 몸부림치는 잎사귀의 무리.....
옮긴이의 말
pp.239-240
학교 선생인 한 남자가 어느 날, 곤충 채집을 위해 사구로 여행을 떠난다. 그 여행은 사구라는, 생명의 근접을 허용하지 않는 땅에서도 모질게 살아남은 곤축을 채집하여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려는 바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여행은, 남자 스스로를 <생명의 근접을 허용하지 않는 땅에서 모질게 살아남은 곤충>으로 변신하게 하였고, 이 세상에서 그의 이름은 실종되고 만다.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자 한 그의 행위가 그 자신을 채집함으로써 완성되는 대신, 존재를 증명하는 이름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다.
*1964년 영화 <모래의 여자>
*너무 내 스타일이에요....
-구멍에 빠진 남자는 탈출을 시도하다, 차차 적응해나가고, 그들과 동화된다.
이 소설을 먼저 읽은 친구들이 좀 우울한 소설이라고 했었는데 그와 다르게 마지막에 이상하게 신파적인 따뜻함을 느꼈다. 소설가가 중간중간에 복선과 같은 장치를 많이 넣은 것 같은데, 그 중 하나 눈에 띄는 것이 '뫼비우스의 띠'였다.
다만 이것이 남자와 여자가 반복하는 노동(특히나 삽질이나 구슬꿰기는 반복적인 수공업의 대표주자가 아닐까싶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섹스와 그로인해 촉발되는 가정이라는 굴레의 시작과도 연관되는 것 같았다. 여자는 아마 소설처음에 밝히고 있듯이, 여자는 이미 남편과 딸을 잃었다고 나온다. 그녀가 다시 관계를 맺고,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그녀에게는 또다른 뫼비우스의 띠가 아닐까.
두 갈래로 나뉘어 지는 현실이라는 구성에서 혹자는 매트릭스와 같은 가상과 현실의 관계와 주인공이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에 연관 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조금 옆길로 새는 생각같지만 아무리 모래의 여자 속 남자가 선택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오랜 시간 빚어진 하나의 선택지만 볼 수 있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되려 이것이 너무나 현실적인 '가정'의 이야기는 아닐까 싶었다.
사구 속 집에서 여자는 이름이 없다. 남자는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긴 시간을 들이지 않고 이내 없어진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관용적으로 한지붕밑에서 산다는 말처럼, 그곳에서 함께 산다는 것은 개인을 부르는 호칭이 몇가지로 추려지게 된다.(이것은 테러의 시 김사과의 소설에서 한번 쭈루루룩 정리가 되었던 것 같다) 달링, 여보, 아내, 남편, 신랑, 자기. 그리고 가정이라는 선긋기의 시작은 섹스에서 시작된 아이의 탄생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것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엄마, 아빠, 누구누구 엄마, 아빠. 호칭의 틀에서 개인은 사라진다. 이것은 세대가 지나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로인해서 나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름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이 소설의 엔딩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생긴다. 자궁외임신으로 병원으로 가는 여자의 사건. 그리고 탈출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출하지 않고 자신이 발견한 것을 여자에게 알려주고자 기대하는 남자. 아마 소설을 읽었다면 알겠지만, 남자는 이미 그전에도 첫번째 탈출을 시도할 때 여자를 떠올린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남자가 무엇인가 이곳에 애착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곧, 그는 결국 '남자'로 남는다는 것이다.
그의 이름은 실종신고서에만 존재하게 되었다.
-사실상 남자 화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여자 화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 인간실격이나 혹은 카프카의 소설처럼 꽤나 많은 인간 실존에 관한 소설들은 여성 화자의 목소리는 없다.
-반복적인 노동은 자기 자신만 책임을 져야 할 때는 하지 않는다. 혹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돈을 벌 수 있는 반복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확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소설의 중간에 나오는 결혼과 성관계에 대해 뫼비우스의 띠씨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인상깊었다.
섹슈얼리티와 반복노동의 관계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았다.